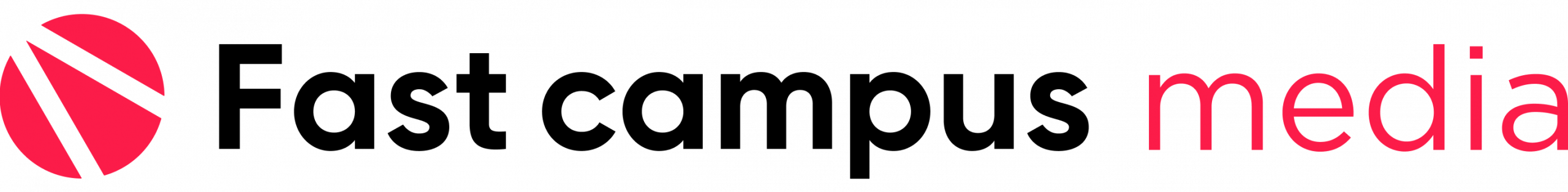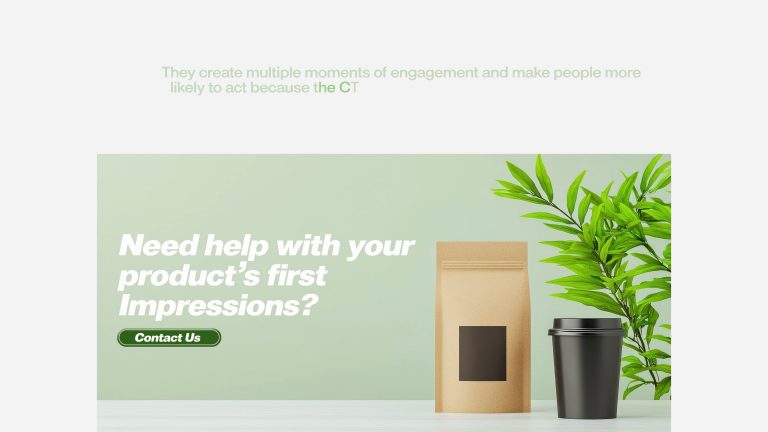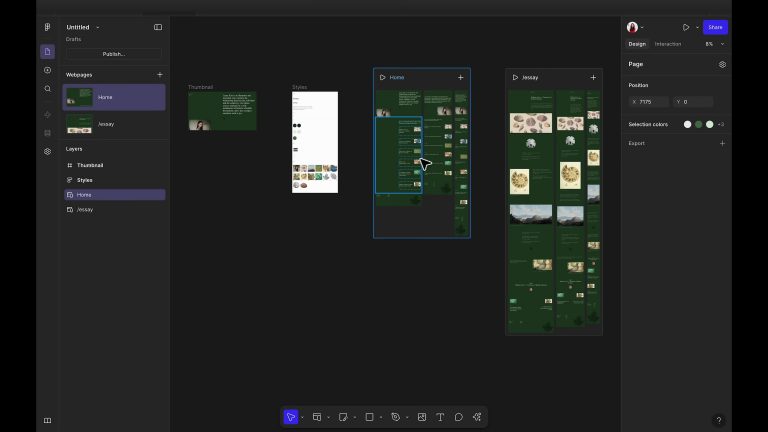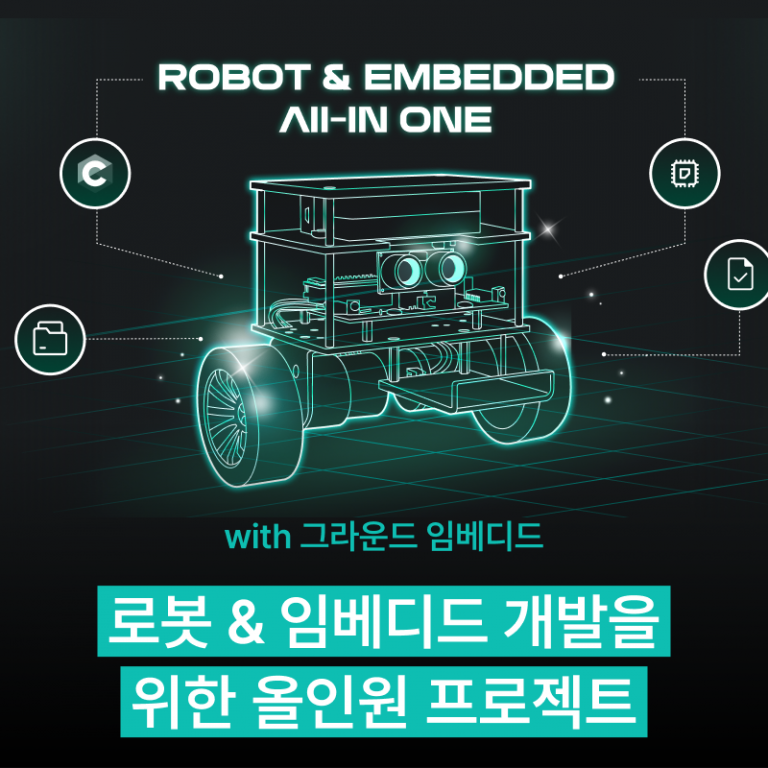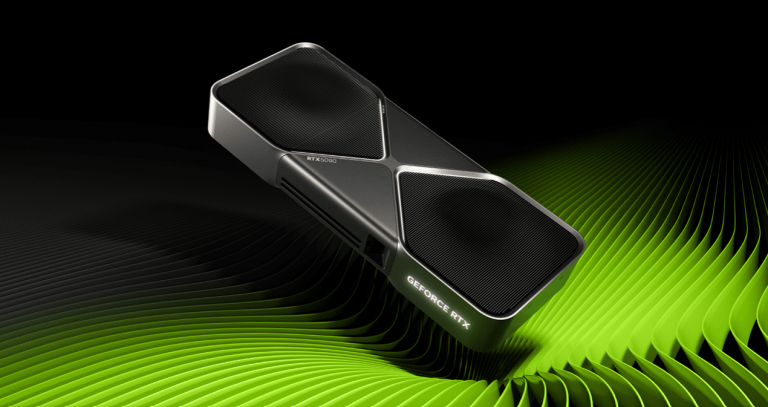Last updated on 3월 6th, 2025 at 02:53 오후
“애플에는 가장 ‘더러운’ 단어가 두 개 있었는데, 바로 ‘브랜드’와 ‘마케팅’이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애플 커뮤니케이션 마케팅부의 부사장을 역임한 엘리슨 존슨, 그녀가 2014년 진행한 99U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애플에는 가장 ‘더러운’ 단어가 두 개 있었는데, 바로 ‘브랜드’와 ‘마케팅’이었다.”라는 말이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회사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고, 그만큼 마케팅을 영리하게 하는 회사가 애플 아닌가? 하지만 애플은 브랜드나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경계했다고 한다. 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면 브랜딩, 마케팅에 목을 매게 되며 그 순간 회사는 발전할 수 없다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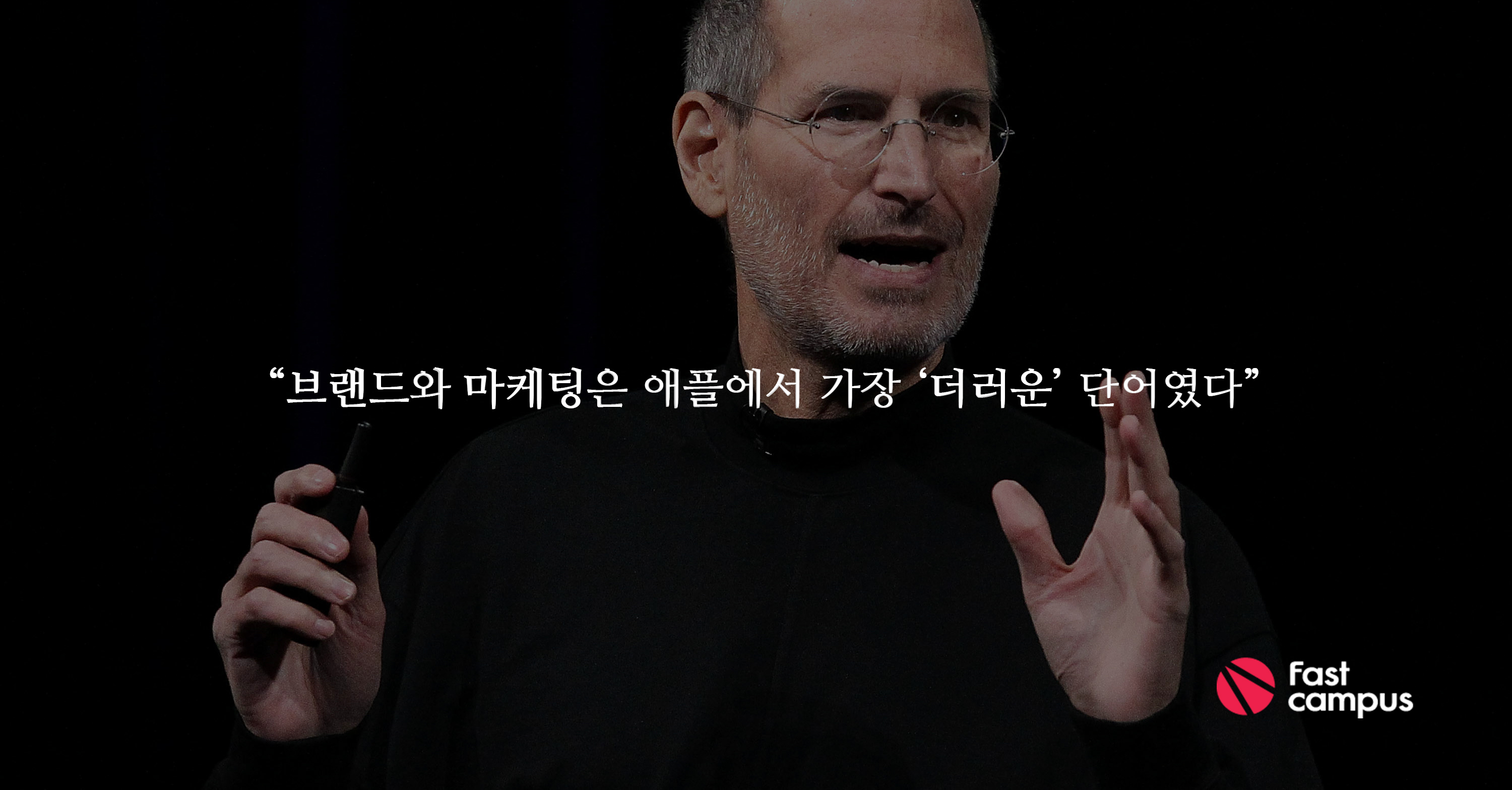
마케팅은 흔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팔기 위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이미 만들어진 상품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유통 채널을 찾고, 고객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광고를 만드는 활동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가 제품과 마케팅을 별개로 생각한다. 매출이 떨어지면 더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거나, 다른 마케팅 채널을 찾는다. 상품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꼭 업데이트를 해줘야 할 때, 신사업을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나오는 활동이다.
하지만 애플의 마케팅을 보면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고, 가격은 얼마고, 어디에서 살 수 있고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제품이 여기 있고, 이 제품으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들의 캠페인을 봐도 그렇고, 광고를 봐도 그렇다. 기술 사양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도 애플은 아이폰이 담고 있던 수많은 장점에 대해 일일이 어필하기보다 제품을 ‘보여주고 설명한’ 것에 그쳤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마케팅을 통해 제품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필하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설득’하려 하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는 애플의 광고에 열광하고, 지갑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마케팅과 다른 접근을 한 그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것이었다. 어떻게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었을까. 그저 ‘그런 건 애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은 시장 점유율이 3%가 될까 말까 했을 때도 ‘제품이 나왔음을 알려주는’ 정도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미지 출처: mac generation
이미지 출처: mac generation스티브 잡스는 ‘브랜드’, ‘마케팅’을 더러운 단어인 양 사용했다. 애플의 관점에서 브랜딩이란 사람들이 제품, 서비스나 보이고 있는 활동만으로는 우리 회사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멋있다고 생각해주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였다. 고객들에게 상품을 팔아야 하지만 제품이 품고 있는 가치로는 원하는 만큼 팔 수가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애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브랜드 가치와 매출은 그들이 내보이고 있는 상품 그 자체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다. 돈을 쏟아붓는 프로모션보다, 강점을 일일이 나열한 광고보다, ‘좋은 제품’의 힘이 훨씬 크다고 믿은 것이다. 마케팅은 그저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방법’이었다. 브랜딩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애플은 먼저 좋은 제품을 만들었고, 이후에 정말 센스 있고 멋진 소개를 했다. 그 ‘멋진 소개’가 그들의 마케팅이자, 브랜딩이었다.
상품과 마케팅을 별개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상품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마케팅팀이 동원된다. 혹은 회사 밖에 있는 에이전시가 이미 나와있는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하는 식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러한 접근은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애플의 마케팅 팀은 엔지니어링 팀 바로 옆에 있었다. 제품의 요소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의도와 목적, 기대하는 바에 대해 마케팅팀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의 제품을 ‘잘 소개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마케팅팀은 누구보다 제품을 잘 알아야 했다. 끊임없이 제품이 디자인되는 과정에서 제품, 엔지니어, 마케팅팀의 책임자들이 미팅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초기 컨셉부터 홍보까지 모든 팀이 한 팀처럼, 같은 비중으로 관여했다.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서 제품의 기능, 디자인, 마케팅이 한 몸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물론 ‘제품’이었다. 마케팅팀과 엔지니어링 팀이 뭉쳐 제조자의 관점, 소비자의 관점을 모두 고려해서 탄생된 ‘좋은 제품’은 그 자체로 빛을 발했다. 완성되고 나면 다음 단계가 명확했다. 제품이 좋으니 사람들이 절로 관심을 가졌고, 그저 제품 자체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세계가 열광했다. 그리고 멋진 캠페인이 끝나더라도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제품 그 자체에 반응한 것이지 캠페인에 반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졌다.

좋은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스티브 잡스의 집착은 대단했다고 한다. 처음 애플스토어를 열고자 했을 때, 오픈을 앞두고 진행해왔던 컨셉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쏟았던 애플이었지만 스티브 잡스의 집착은 막을 수 없었다. 결국 3개월 이상이 늦춰진 날짜에 오픈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은 빈번했다. 출시 일자가 임박했는데도 제품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번이나 변경을 요구하곤 했다. 오죽했으면 임직원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잡스의 ‘완벽한 제품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의 애플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벽한 제품’에 대한 고집이 애플의 모든 활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애플만의 감성, 디자인, 광고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제품’이다. 많은 회사들이 이를 간과하고 그저 마케팅만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제품’이라는 본질을 거치지 않고 우러나온 마케팅은 일회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하나의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그 순간에는 반응이 좋을지 몰라도 끝나고 나면 금방 수그러들고 말 것이다.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자, 어쩌면 본질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회사의 마케팅은 ‘팔기 위한 것’인가 ‘소개하기 위한 것’인가?
출처/참고
The Two Words Steve Jobs Hated Most – Entrepreneur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 – 동아비즈니스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