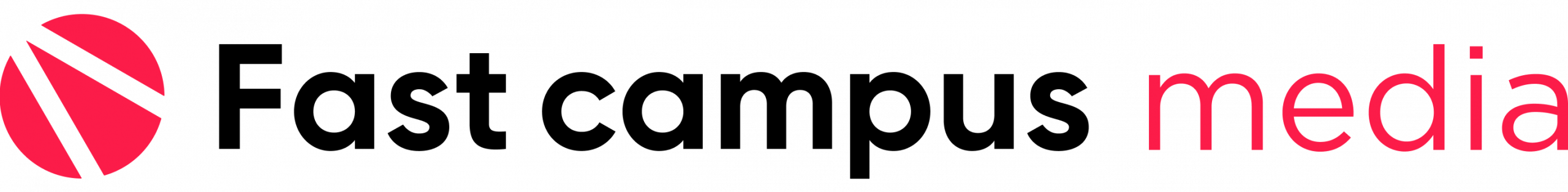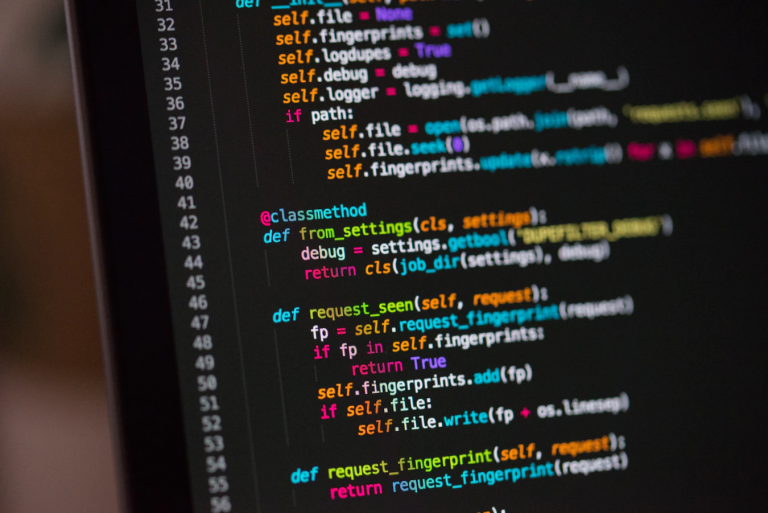Last updated on 3월 6th, 2025 at 02:55 오후
나는 방송국 리포터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카카오 자회사 dk techin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었다. 지금은 담담하게 말하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다. 나는 프로그래밍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방송국 리포터였기 때문이다. 성우를 꿈꿨었고 연극과를 졸업했다. 심지어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날의 내 나이는 스물여덟이었다. 모두가 늦었다고 하는 나이.
성우를 꿈꿨던 시절
어릴 적부터 만화가 좋았다. 자연스럽게 성우를 꿈꾸게 됐고 이루기 위해 연극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까지 나는 그 길을 걸었다.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 KBS의 프리랜서 리포터로 일을 했다. 각지를 오가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6시 내 고향’의 나래이션을 맡기도 했다. 꿈꿨던 길이었기에 만족스럽기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프리랜서였고 프리랜서는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정식 성우가 되기 위해선 피를 깎는 노력 외에도 많은 게 필요했다. 방 값부터 식비까지 모두 감당하면서 계속 배고픈 삶을 이어나가야 했는데, 그 와중에 높아져만 가는 성우 경쟁률을 보니 자꾸 힘들 거라는 생각만 들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다
스물여덟, 늦은 나이가 아니었다
부모님은 내가 아나운서가 되길 바라셨다. 그래서인지 기대를 저버리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많이 반대하셨다. 스물여덟의 나이에 무언가를 시작해서 일을 하며 돈을 번다는 거 자체가 상상이 안 되셨던 것 같다. “4년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널 뽑겠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걱정이 많으셨다. 같은 연극과의 친구들은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무척 의아해했던 기억이 난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가 연극과를 나와서 개발자가 되겠다고 하겠나.
하지만 정작 나는 걱정이 없었다. 걱정이 됐다면 시작할 용기도 못 냈을 거다. 어디서나 프로그래밍의 유망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던가. 전망이 뚜렷했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면 되지 뭐’ 정도의 생각으로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무모하긴 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스물여덟은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었다.

급하게 가면 안 된다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한 나의 첫 발걸음은 ‘국비지원 안드로이드 게임 개발 과정’이었다. 6개월 동안 매일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다.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예 생소한 분야다 보니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마치 전혀 모르는 외국어 수업을 듣는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너무 빠른 진도였다.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었다. 조금은 일방적인 교육방식이었다.
이 과정이 의미가 없진 않았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운 곳이었고 실제로 이 과정을 끝내고 프로그래머로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에 취업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결국 해냈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내가 개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뿌듯하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계가 느껴졌다. 할 수 있는 일만 계속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겉핥기 식 공부만을 했기에 고도화된 일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계속 같은 일을 하는게 너무나 싫었다.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결국 서른 살, 1년 반 만에 회사를 그만 뒀다. 더 많이, 탄탄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게임 개발이 주었던 회의감은 나를 웹 개발로 이끌었다. 웹 개발을 하면 모바일 UI와 컴퓨터 UI를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패스트캠퍼스의 프론트엔드 단기 교육 과정을 찾았다. 국비지원과 가장 달랐던 점은 강사님이었다. ‘야무’라는 필명을 쓰는 강사님은 정말 막히는 게 없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명쾌한 대답이 돌아왔다.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너무 급하게 배워 탈이 났던 나는, 그렇게 다시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다. 흩어져있던 퍼즐 조각 같은 지식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늦더라도, 제대로
서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나는 더 준비하고 싶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패스트캠퍼스의 3개월 전일제 과정인 ‘프론트엔드 개발 SCHOOL’이었다. 사실 이 과정을 듣지 않고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다. 채용 연계 과정부터 검증된 커리큘럼, 신뢰가 가는 강사님, 소카, 왓챠 등이 포함돼있는 유수의 참여기업까지, 많은 요소들이 이 과정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참여 기업 특강이 특히 좋았다. 기업에서 담당자가 와서 문화에 대해, 입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실무에서 쓰이는 기술에 대해 직접 말해줬다. 현업과 동 떨어진 지식이 아닌, 진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야무)강사님이 디자이너 출신이라는 것도 만족스러웠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다.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협업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리드를 만드는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디자이너와 소통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노하우였다.

새로운 시작
그렇게 3년 간의 방황(?)을 한 뒤에,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dk techin에 입사하게 됐다.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일때와 무모함과 용기,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얻었던 깨달음이 머리를 스쳐간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떠할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또 다른 좌절에 빠져 힘들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어느 때보다 탄탄한 준비가 되어있고, 설레인다.
어떤 경험도. 어떤 시행착오도 쓸데없는 것이 없다. 리포터 경험은 커뮤니티 활동이 중요한 개발자 세계에서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너무 급하게 공부를 했던 경험은 내게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게 했다. 그리고 스물여덟은 늦은 나이가 아니다. 어려웠고 무모했던 그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마음이 가는대로 할 수 있을때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했기에 지금 설레일 수 있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