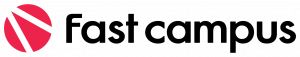“젊은 나이에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복권을 사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을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스튜디오, 잡지사,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다. 그리고 지금은 푸드 딜리버리 O2O 회사 ‘푸드플라이’에서 일하고 있다. 특이한 점이라면 나는 이전 회사에서는 UI 디자이너였지만, 지금 몸담고 있는 ‘푸드플라이’에서는 ‘개발자’라는 것이다. 아직 어린 나이인 27살에 참 많은 곳을 다녔고, 많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다양한 회사를 거친 것에, UI 디자이너에서 개발자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혹은 방황을 뭐 그렇게 많이 했느냐며 핀잔을 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의 방황은 지극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고 스튜디오, 잡지사, 화장품 회사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며 나는 계속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스스로 ‘나는 지금 즐거운가?’하고 되물었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 했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했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명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회사를 옮겼다. 다시 말해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세 번이나 이직을 한 것은 내가 즐겁지 못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다. 누군가는 유래 없이 힘든 취업 시장에서 안주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건 사치이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겐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러던 중, UI 디자이너로서 일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흘렀을 때 나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스스로 UI 디자이너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보고도 그게 잘 한 건지 못 한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디자인은 ‘감’으로 이루어지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디자인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이름이 높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 대중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좋은 디자인이 되곤 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며 쌓인 규칙과 진리는 있었지만 작업자의 감이 떨어지면 더 발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파악해 계속해서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디자인의 속성이 잘 맞는 UI 디자이너들도 많았다. 하지만 나에겐 도저히 맞지 않았다. 감각에 의존하는듯한 느낌이 답답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실력이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스펙 같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량화할 수 없는 디자인 분야에서는 아무리 해도 즐겁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UI 디자이너였지만 개발자와의 협업이 빈번했다. 내가 작업한 디자인이 웹, 앱을 통해 구현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어깨너머로 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멋있다는 생각을 했다. 개발자들은 자기의 사고를 코드라는 실체로 표현해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구현되니 어떤 것이 잘 된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보였다. 또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어떤 공부를 해야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명확했다. 그런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기에 계속해서 개발에 대한 흥미가 커졌다.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한동안 디자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원하는 바를 찾기 위해 헤맸었다.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분야를 돌아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디자인과 접점에 있는 정말 간단한 코드, 이를테면 COLOR 값을 입력하는 법부터 시작해 생활 코딩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공부해보며 개발을 처음 접하게 됐다. 즐거웠다. 이곳에는 답이 있었다.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기분이 들었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이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디자인을 할 때 풀지 못 했던 욕구를 풀 수 있었다. 경험이 쌓여가며 ‘만약 내가 개발하는 일을 한다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견고해졌다. 동시에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어렵지 않았다. 말했듯이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였다. 그때 패스트캠퍼스 프로그래밍 풀타임 교육 과정을 알게 됐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3개월 간 매일 수업을 듣고 공부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나처럼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시작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일하던 곳의 개발자들과 팀장님들도 이곳을 추천했다.
개발 분야는 정말 다양했다. 크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었었는데 나는 앱 디자인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클라이언트 분야가 더 좋았다. 앱이 웹보다는 사용자들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앱 개발을 선택했다. 그리고 길이 너무 다양한 안드로이드보다는 iOS가 좋았다. 이러한 이유로 [iOS 개발 SCHOOL]을 선택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 당시 나의 개발 지식이 얼마나 전무했는지를 말하자면, 서버가 뭔지도 몰랐고, 코드가 컴파일 된다는 것의 의미도 몰랐다. 개발 용어를 들으면 접해본 적 없던 언어를 듣는 느낌이었다. 그냥 아예 몰랐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iOS 개발 SCHOOL에서는 몰라도 괜찮았다. 야곰 강사님과 주영민 강사님은 하나하나 쉽게 표현을 해주셨다. 질문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 비 전공자라도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현업에서 개발자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노하우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거였다. 한 번은 송금 서비스 ‘토스’의 개발자 분을 초빙해서 조언을 들었다. 현업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능력, 본인이 만일 다시 입사 전 공부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더 집중했을 것 같은 공부가 무엇인지 등. 하나하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었다. 단지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현실의 분위기와 필요한 센스를 배울 수 있었다.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모르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갔다. 그동안 고민해왔던, 답을 찾지 못 했던 답답함이 모두 풀리는 기분이었다. 내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답’이 있었다. 나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갈수록 이 길이 나와 맞는다는 확신이 강해졌다.

iOS 개발 SCHOOL을 졸업하고, 나는 푸드 딜리버리 O2O 스타트업 ‘푸드플라이’에 개발자로 입사했다.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회사고, 많이 배우고 있다. 그 느낌이 정말 좋다.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 이제는 최소한 2, 30년은 이 분야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많이 헤맸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나에게 딱 맞는 일을 찾은 것 같다. 누군가는 대학 전공과도 동떨어진, 몇 년간 걸어온 그 길에서 멈춰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불안하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젊다면,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인생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복권을 사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걷고 있는 길에 의심이 생긴다면, 과감한 도전도 괜찮다.

iOS 개발 SCHOOL 수료생 이홍화님